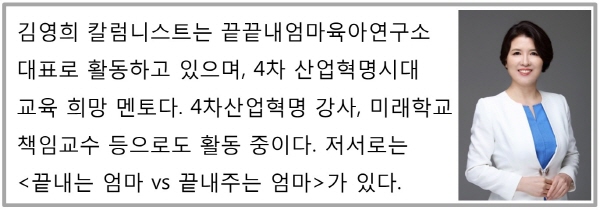‘끝내는 엄마 vs 끝내주는 엄마’ 김영희의 육아일기⑬

[한국강사신문 김영희 칼럼니스트] 신생아는 하루에 대소변을 10번 이상 본다. 이유식을 먹으면서 변보는 횟수가 줄기 시작한다. 생후 12개월이 되면 하루에 2~3회 변을 본다. 고형식을 먹기 시작하면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려 변 횟수가 줄어든다. 엄마는 아이의 대소변 색깔에까지 예민해진다. 대소변은 아이의 건강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다. 대변 색깔은 황, 녹, 쑥, 빨, 흰, 검으로 다양하다. 건강한 아이의 변은 황금빛이다. 승우가 황금 빛 똥을 누면 ‘이건 6자 같네’ 하며 승우 몸에서 나온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게 했다. 그러다 보니 똥 누는 것도 놀이의 일부로 느꼈다.
가끔 승우가 밤에 실수로 소변을 볼 때가 있었다. 나는 무심히 그것을 처리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훈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나였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잘못에는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친구를 때렸다면 혼내고 얼러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아이가 일부러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을 리는 없다. 어리기 때문에 생리적인 부분에 대한 제어 미숙으로 일어난 일종의 ‘사고’인 것이다.
아이의 어쩔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부모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해 줘야 한다. 아이에게 있어 불가항력의 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좀 자라면 말끔히 해결 될 일이었다. 실제로도 그랬다.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서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리곤 했다. 할머니는 그것을 못 본 척했다. 나는 그게 참 감사했다. 만약 할머니가 내 실수에 대해 혼을 내시거나 잔소리를 하셨다면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반감이 더 컸을 것이다. 남의 실수를 덮어줄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양육은 대물림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은 대로 자식에게 행동한다. 잘못된 고리는 과감히 끊어야 한다. 좋았던 점은 이어가고, 자신의 선에서 교정할 육아법은 과감히 좋은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 에리히 프롬은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요즘은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맡아 기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부가 모두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다보니 자식을 기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솔직히 워킹 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이의 조부모일 것이다.
조부모는 조부모식의 교육관을 손자에게 답습한다. 물론 장단점이 있다. 문제는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만의 교육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개선할 점인지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아이의 버릇이나 성격이 한번 고착되면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이가 스스로 의도치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땅에 묻고, 잘한 것을 캐내어 칭찬해 주어야 한다.
아이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일이다. 아이는 미숙하다. 연습을 거듭하며 완성에 이른다. 과거에는 자면서 소변을 자주 보는 아이에게 충격요법을 썼다. 오줌싸개 아이에게 키를 씌어 이웃집에 가 소금을 얻어오게 했다. 아이에게 모욕감을 줘 버릇을 고치려던 풍습이었다. 아이는 이웃이 뿌리는 소금 세례를 받았다.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 참고자료 : 김영희의 『끝내는 엄마 vs 끝내주는 엄마(가나북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