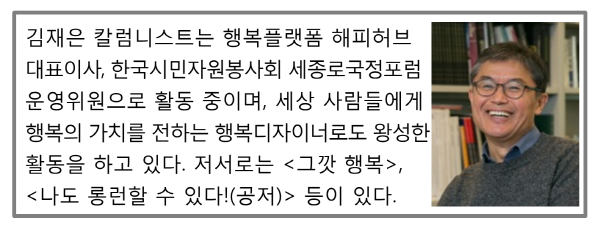[한국강사신문 김재은 칼럼니스트] 문득 꽤 오래된 영화 박광수 감독의 ‘칠수와 만수’가 생각났다.
그림에 소질을 가진 동두천 출신의 칠수는 미국에 사는 누나의 초청장을 기다리던 중, 생계 수단이던 극장 미술부를 그만두게 되어, 장기 복역 중인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에 고통 받는 만수의 조수로 들어간다. 여대생 지나로부터 실연을 당한 후, 누나로부터의 연락마저 두절되어 휘청거리던 칠수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던 만수는 거대한 간판 작업을 마친 어느 날 저녁, 옥상 광고탑 위에서 벌인 푸념 어린 장난이, 투신자살 기도로 오인 받아 경찰의 출동을 부른다. 이로 인해 결국 만수는 낙상하고, 칠수는 경찰에 끌려가게 된다.

난데없이 이 영화가 생각이 난 것은 영화의 내용보다는 칠수(박중훈)와 만수(안성기)라는 명콤비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투캅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라디오 스타 등 여러 영화에서 함께 하며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 준 두 배우의 관계가 무척이나 부러워서 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들 명콤비처럼 누군가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희로애락의 인생길에서 때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작은 위안이 되고 응원을 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고 행복일까.
그래서 그런가. 누군가 말했다. 진심어린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스승이 없고, 진정한 친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학연, 지연, 혈연에 더해 디지털, 인터넷 시대가 되어 생각이상으로 수많은 관계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양적으로 그러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사이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하니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여기에 ‘그렇지 않다’며 반기를 들고 나온 두 사람, 또 하나의 ‘칠수와 만수’가 있다. 명콤비라는 말 대신 따뜻한 우정이 우러나오는 형제 같은 사람 말이다. 지연, 학연, 혈연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만나려 해도 만나기 어려운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다.
몇 해 전이었다. SNS에서 인연이 되어 몇몇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돕는 편한 모임이다. 두 사람은 거기에서 처음 만났다.
어라 그런데 두 사람이 지내는 것을 보니 따뜻한 친구, 형제 이상이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서로 도와 가는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고 보기 좋던지. 그것도 깎듯 한 예의까지 깃들여서. 관계플랫폼이라는 내가 질투가 날 정도였다. 돈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식, 형제들끼리도 척을 지고 지내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물론 두 사람의 성품과 사람 됨됨이의 시너지 효과일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심을 담은 이해와 배려, 성심이 있는 우정 나눔이 낳은 선물인지도 모르겠다. 날로 각박해져 가는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따뜻함이 깃든 의리라고나 할까.
문명의 이기를 기계적으로 이해 타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때이다. 마음을 담은 손 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단순한 문자 메시지 인심조차 박한 시대이다. 짧은 안부 전화, 응원의 말 한마디가 때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두 아우, 천과 민수!~ 두 사람의 우정이 그대로 쭈욱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줄 거라 믿기에.
※ 출처 : 교차로 신문 ‘아름다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