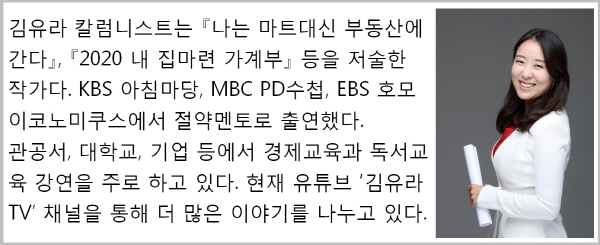[한국강사신문 김유라 칼럼니스트] “어제 뉴스 봤어? 그 증권회사 직원이 자살했대...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를 데리고 산책 겸 공원에 나갔다가 우연히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때가 2008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고, 아이를 키우느라 텔레비전을 없앤 탓에 세상의 소식에 어둡기만 하던 때였다.
어렵게 얻은 첫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 또 그만큼 서툴 수밖에 없는 육아에 허덕이며 오직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만 위하며 살던 시절이었다. 당시 나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을까’뿐이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그날도 통 잠을 안 자고 보채기만 하는 아이도 달랠 겸, 잠시 바람이라도 쐴 심산으로 공원을 찾은 터였다. 평소라면 아이를 살피느라 주변의 대화에 무심했을 텐데, 그날따라 옆 벤치에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아마도 ‘펀드가 휴지조각이 돼...’,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쳐...’ 같은 대화 속 문장들이, 잊고 살던 무엇을 떠올리게 했던 모양이다.
임신으로 그만두기 전까지, 나는 국민은행 텔러 1기 계약직으로 지점에서 근무했다. 맞벌이를 하던 시절, 우리 부부의 수입은 월 350만원 정도였다. 그중 100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50만원은 모두 저축했다. 각자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쁘고 피곤해 돈 쓸 틈이 없었다.
사실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 때 만나 연애를 시작해서인지, 우리는 둘을 위해 돈을 쓰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커피숍을 간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였고, 비싼 외식은 당연히 꿈조차 꾸지 못했다. 극장에서 영화를 함께 본 기억도 거의 없다. 그러니 자연스레 돈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
매달 250만원씩 1년을 모으면 원금만 3천 만원이었다. 이렇게 꾸준히 저축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욕심이 났다. 기왕이면 좀 더 수익률이 높은 데 투자하고 싶었다. 2006년 11월, 우리가 결혼했을 무렵엔 펀드가 대유행이었다. 가입을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마침 나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다.
은행 지점장이고 직원이고 고객이고 할 것 없이 모두 펀드 계좌를 한두 개 이상씩 개설했다. 수익률도 엄청났다. 펀드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나라고 펀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몇 주, 아니 단 며칠 사이에 몇 프로씩 오르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기에, 1년에 몇 프로 이자가 붙는 예금이나 적금 따위에는 눈길이 가지 않았다.
분산투자를 한답시고 중국 펀드, 일본 펀드, 국내 펀드, 호주 부동산 리츠 등 골고루 계좌를 개설했다. 특히 중국 펀드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 중국 펀드의 경우, 자고 일어나면 단 하루 만에 몇 퍼센트씩 올라 있을 정도로 변동성(자신의 가격 또는 가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컸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거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믿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니 틀릴 리 있겠냐는 막연한 믿음이었다. 그렇게 신혼 때 맞벌이로 모은 돈을 모두 펀드에 올인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남편의 월급을 아껴 꾸준히 저축했고, 목돈이 만들어지면 바로 중국 펀드에 돈을 더 넣었다.
모두가 중국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이라 예상, 아니 확신하던 때였다. ‘중국’은 곧 ‘기회’요 ‘돈’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름 열을 올렸던 재테크도, 아이를 낳고 육아에 허덕이다보니 계속 신경쓰기 쉽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 외에 그 무엇에도 관심을 기울일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가 너무 예뻐 나 스스로도 다른 데 눈을 돌릴 마음이 없었고 말이다. 한동안 중국이니, 펀드니 하는 것들은 아예 잊고 살았다. 가끔 ‘펀드는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할 때도 있었지만, ‘알아서 잘 불어나고 있겠지?’ 믿으며 넘어가곤 했다. 오히려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점점 늘어나고 있을 재산에 든든함마저 느꼈다. 그러다 공원에서 우연히 심상치 않은 소식을 접한 것이다.
‘펀드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그래서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그것도 증권사 직원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집으로 돌아왔다. 짜증내는 아이를 안아 달래며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한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펀드 계좌를 확인했다.
그리고 말 까무러칠 뻔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펀드가 반토막이 난 것이다. 국내 펀드보다는 해외 펀드의 실적이 더욱 심각했다. 미국 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 폭등하고, 2000이상 갔던 코스피지수가 900대까지 떨어져 있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였다.
※ 참고자료 : 김유라의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 돈도, 시간도 없지만 궁색하게 살긴 싫었다(차이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