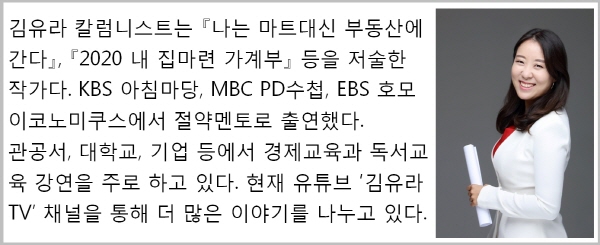[한국강사신문 김유라 칼럼니스트] 이때쯤 우울증이 생겼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자책에 독박육아의 어려움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의 무게마저 더해져, 나를 바닥으로 한없이 끌어내렸다.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사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기대했던 바가 있었다.
첫째아이가 순하디 순하니 둘째를 잘 돌봐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생이 태어나자 천사 같던 첫째가 악마가 되어버렸다. 갓난아기인 둘째의 배를 발로 밟으려 하거나, 밤중수유를 하면 젖을 주지 말라고 엉엉 울기 일쑤였다. 안 그래도 잠도 못 자고 수유하는 게 힘든데 첫째까지 깨서 울어대니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첫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베란다 나가서 쌀 뿌리기, 아무데나 오줌 싸기 등 미운 짓만 골라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미친 여자처럼 소리 지르고 폭발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첫째는 ‘엄마는 동생만 예뻐하고, 나만 미워해’라고 생각하며 더욱 삐뚤어졌다.
아이를 하나 키울 때와 둘 키울 때는 천지차이였다. 뭘 하려고 해도 첫째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어야 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상전을 모시는 기분이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순탄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나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결혼 전에는 자상한 남편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잔소리만 엄청 많았다.
할 줄 아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더 많았다.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못하는데”라는 말을 자주했다. “아니, 나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세상에 해본 일만 하고 사나?” 하는 내 속은 터질 것만 같았다. 뭘 고쳐달라고 해도 묵묵부답, 뭘 버려달라고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내가 직접 드릴을 빌려서 고치고 내 몸보다 큰 짐을 낑낑대며 날라야 했다.
게으른 것으로 치면 남편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걸 결혼하고 깨달았다. 결혼생활에서는 둘 다 게으르면 둘 중 덜 게으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자라온 환경과 사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그걸 적응하고 이해해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했다기보다 포기하고 산다는 편이 맞겠다.
이해든 포기든 그건 나중의 일이고, 이때는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나는 늘 하인 같은 존재라는 절망감이 밀려들었다.(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사족 같지만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 싶어 밝히자면, 그렇다고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랑하니까, 그만큼 내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 더 힘들고 아팠던 것이다.
그리고 첫째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든 감싸주고 다독여주려 애썼고, 결국엔 아이와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었고 말이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밖에 나가 바람이라도 쐬면 기분 전환도 되고 했을 텐데, 돈도 돈이거니와 잠시도 눈뗄 수 없는 어린아이가 둘이나 딸려 있으니 집 앞에 나가기가 힘들었다. 아이를 데리고 멀리 나가기 쉽지 않고, 교통비도 아끼려다보니 걸어서 30분 거리의 공원, 놀이터가 내가 갈 수 있는 전부였다. 갇힌 공간과 소비의 제약 속에서 내 발길이 닿을 곳은 결국 무기력의 수렁뿐이었다.
펀드로 돈을 잃고 한동안 열을 올렸던 독서에 대한 의지도,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열정도, 아이들에게만은 풍족한 환경을 주고 싶다는 다짐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땐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다.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이때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만 남겨두려는 모양인지 힘들고 재미없던 이 시절의 기억은 꿈에 본 듯 흐릿하기만 하다. 종일 멍하니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던 때라 기억도 멍한가보다.
※ 참고자료 : 김유라의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 돈도, 시간도 없지만 궁색하게 살긴 싫었다(차이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