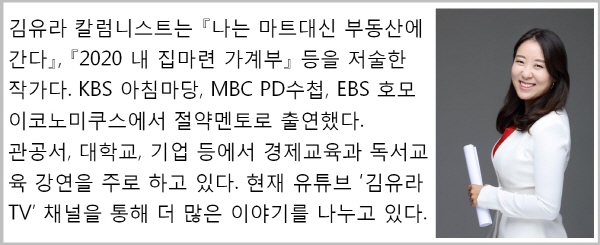[한국강사신문 김유라 칼럼니스트] 그 무렵 스콧 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읽으며 나에게 자기애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다.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나가려는 의지.’
나는 어떤 사랑을 했나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을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단순히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지각 있게 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각 있게 주지 않는 것이었다.
책을 읽으며 되짚어보니 아이들을 키우며 내가 느낀 무기력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못했던 내 내면아이의 슬픔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나는 한 번도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아이가 받고 있는 사랑을 질투하고 부러워했던 모양이다. 내가 받지 못한 만큼 커다란 사랑을 주고 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들이 야속했다.
잘해주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었다. 나는 어려서 밥 먹기 싫어할 때마다 야단을 맞았다. 김치와 김뿐인 식탁에서도 반찬투정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먹기 싫어”, “이 반찬 맛없어”라는 말을 서슴없이, 심지어 거의 매일같이 반복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기보다 몹시 부러웠다. 싫다고 말해도 혼나지 않고 안 먹겠다고 떼써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책을 읽어주고 일정표까지 짜가며 아이들과 놀아줄 때 힘들었던 이유는,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배운 적 없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받아보지 못한 걸 주어야 하니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어디까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응당 해줄 일이고, 어디부터 아이에게 절제를 가르쳐줄 일인지 알지 못했다.
아이가 밤에 자지 않고 놀아달라고 생떼를 부릴 때 졸음을 참고 놀아준 적도 많았다. 그야말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억지 노력을 한 셈이었다. 내가 이렇게 무리해가며 사랑을 주었으니 당연히 내가 원하는 아이로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아이를 사랑하기 전에, 나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선언했다. 잘난 아들을 키우는 못난 엄마가 아니라, 멋진 엄마 멋진 아들로 함께 성장하겠다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주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로 채우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직접 되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무한계 인간이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엄마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나와 같은 아이로 키우겠다.’
※ 참고자료 : 김유라의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 돈도, 시간도 없지만 궁색하게 살긴 싫었다(차이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