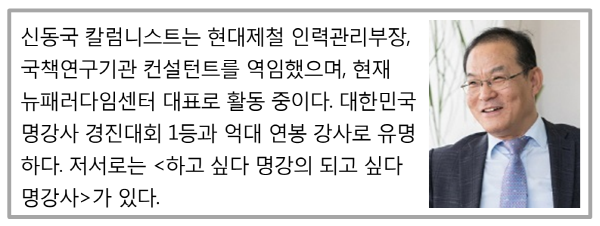[한국강사신문 신동국 칼럼니스트] 영화 <건축학 개론>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앞으로 지을 집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싸이트십을 고려해서 플래너를 아주 플렉서블하게 디자인해본 거야. 집 안에 중저음 스페이스를 보이드하게 둠으로써 오히려 스페이스가 다이나믹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여자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데도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 간다. “빡쉐한 타입에 리듬감을 부여해서 주변의 랜드 스케이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야. 스페이스를 디바이드하고…….”
그러자 여자가 더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왜 죄다 영어야? 영어마을 짓니?” 남자가 남발하는 전문 용어를 여자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
어려운 전문 용어나 외래어를 남발하는 강사를 종종 현장에서 만난다. 청중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강의는 ‘독약’과도 같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그 순간부터 청중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난해한 용어들이 자꾸 나오면 청중은 딴 생각을 하게 된다. 주의가 산만해진다. 지루해하다가 졸기도 한다. 심지어 강사에게 반감을 품는 사람도 생긴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강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아주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입에 배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유식해 보이기 위해 또는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어려운 용어를 써야 질문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강사도 있었다.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두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사실은, 강의를 통해서 청중의 이해도를 촉진해야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다음 단계인 청중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동기부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강의는 결국 실패한 강의가 된다.
내가 예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강사나 대학 교수 등을 초빙해서 특강을 들었다. 어느 대학 교수를 초빙했고, 그분이 강의 슬라이드를 비추는데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 자기가 독일 유학파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슬라이드가 100% 독일어였다. 강의 내용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기에, 강의를 듣는 내내 잡생각만 들었다. 그 강사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청중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강의는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어려운 전문 용어나 외래어, 한자어 등은 청중의 수준을 고려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각적인 슬라이드도 쉽게 표현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숫자나 데이터를 표현할 때도 그대로 인용할 경우 독약이 될 수 있다. 수치로만 표현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치를 제시할 때도 청중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보겠다.
2007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 때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조간신문부터 읽는데 “흘러내린 기름의 양이 12,547킬로리터이며, 피해 면적이 8000헥타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온 국민이 보는 신문인데 숫자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이 유출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표현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반면에 그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앵커가 “흘러내린 기름의 양이 실내 수영장 세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며,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열 배에 달한다”라고 보도했다.
여러분은 신문 기사와 뉴스 앵커의 멘트 중에 어떤 표현이 쉽게 와 닿는가?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왜? 주위의 친숙한 것에 빗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것처럼 주위의 친숙한 사건, 사물, 인물 등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 것을 ‘친밀성 전략’이라고 한다. 따라서 숫자나 데이터를 말할 때에는 이런 식의 친밀성 전략을 구사해야 청중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청중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어느 순간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다’, ‘청중이 뭔가 답답해한다’ 등등의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TV 뉴스에서 앵커가 즐겨 쓰는 친밀성 전략을 응용해보기 바란다. 우리는 앵커가 어렵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앵커가 단순하게 숫자와 데이터만 나열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여기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다.
내 강의가 어려운 전문 용어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또 숫자나 데이터를 제시할 때는 그 양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은지 따져보아야 한다. 어려운 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숫자나 데이터는 주위의 친숙한 사물과 연결시켜 표현하기 바란다. 상황에 따라 이미지를 가미해서 설명한다면 금상첨화다.
※ 참고자료 : <하고 싶다 명강의 되고 싶다 명강사(끌리는책,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