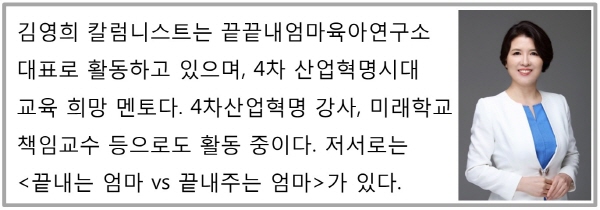‘끝내는 엄마 vs 끝내주는 엄마’ 김영희의 육아일기 ①

[한국강사신문 김영희 칼럼니스트] 그렇다. 내가 갓 엄마가 되었던 시절, 28살 때.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 쯤, 친정어머니께 버릇처럼 했던 말이다. 지금에 와서는 1980년대도 추억해야 할 까마득한 과거가 되어 버렸다. 최근에 제작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포스터를 봤다. 그 시절 유행했던 청바지를 입고 한껏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주인공들. 그래, 그땐 나도 그랬다. 당시 난 20대였고 육아에 있어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 얘기를 아들에게 했더니 ‘근자감’이란다.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 그래 딱 그거였다. 당시까지 존재해 오던 각종 유아 노하우들은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서점을 찾아다니며 빼곡하게 꽂혀 있는 신간, 자녀 교육서들을 훑어보곤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 80년대에 초보 엄마로서의 삶을 보냈던 나도 이제는 ‘과거의 노하우’ 만을 가진 한 사람일 뿐일까. 순간 하나의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친다. “아니야. 내가 해줄 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은 지금도 쓸 만하다고”
아마 친정어머니께서도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지만 과거, 지나온 역사에 대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낡은 것’이라는 편견을 깨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나도 20대 때에는 애가 칭얼거리기만 해도 겁부터 덜컥 나던 초보엄마였다. 얼마나 막막하던지. 도대체 얘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가긴할지, 그 시간이 까마득하게 느껴지곤 했다. 내 또래의 엄마들에게 참 많이도 물어봤다. 지금처럼 손쉽게 인터넷에서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니 말이다.

내 주변의 어린 동생들이 이젠 어엿한 초, 중, 고등학생의 엄마가 되어간다. 요즘엔 그들이 내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자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참 많은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현대의 ‘스마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내게 “언니는 애가 이럴 때 없었어요”, “애가 이러는데 어쩌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범람하는 정보와 인터넷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난 그간 듣도 보도 못한 획기적인 육아법이나, 실천하면 당장 애가 똑똑해지는 거창한 방법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그저 한 아이를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억척스럽게 키운 한 엄마일 뿐이다.
그렇다. 특별할 것 없는 한 엄마였을 뿐이다. 옆집에 사는 그런 수 많은 엄마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칼럼을 통해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정말 힘들었어. 그 마음 이해해” 이제부터 내 경험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려 한다. 한 아이와 내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맺은 후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이다. 실수한 것, 잘한 것, 내가 좀 더 신중히 대했어야 했던 일들에 대해 여과 없이 적어 보았다. 잘한 측면만 부각시켜서는 반쪽짜리 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칼럼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생각은 없다. 다만 공감하고 싶다.
※ 참고자료 : 김영희의 『끝내는 엄마 vs 끝내주는 엄마(가나북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