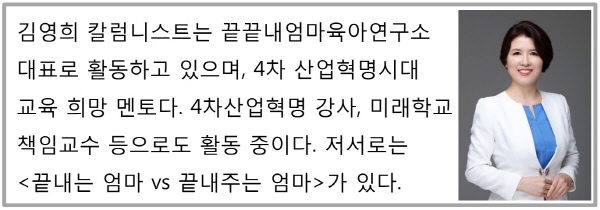‘끝내는 엄마 vs 끝내주는 엄마’ 김영희의 육아일기 ②

[한국강사신문 김영희 칼럼니스트] “아~직 멀었네요”
여자가 아이 낳는 일은 축복이자 고통이다. 주변 사람들 모두 산모가 순산하기를 바란다. 나도 당연히 순산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실 사는 게 다 그렇다. 계획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될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 내 출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다들 그런 난산이 없다고 했다. 그 때를 떠올리면 참 시작부터 험난했다.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애를 쑥쑥’ 잘도 낳는 얘기만 들어오며 임신했던 터였다.
30여 년 전 여름이었다. 장마철로 접어들어 참 후덥지근했다. 그런 때에 첫아이의 진통이 왔다. 장장 22시간 동안 이어진 진통의 시작이었다. 남편은 새벽부터 서둘렀다. 우리 부부 둘 다 어린 20대였다.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무작정 택시를 불러 타고 산부인과로 향했다.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니도 올라오셨다. 간호사가 말하길 “산모가 웃으면서 들어오는 걸 보니 아~직 멀었네요~”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앞으로 있을 고통을 예견할 수 있었다.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웃음으로 애써 감추고 있었는데 겁을 주는 격이었다.
얼마나 오래 아파야 아이가 나오는 거지? 애 낳다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렇게 산모 대기실에서 여장을 풀며 산부인과에서의 하루가 시작됐다.
애가 태어나기 4개월 전, 우리 부부는 아이에 대한 소박한 바람을 담아 자그마한 글을 한번 써보기로 했다. 그 제목, 지금 봐도 참 거창하다. ‘자녀를 위한 기도’였다. 남편은 그것을 자신의 스케줄 수첩에, 책상 위에 여기저기 베껴놓았다. 꽤나 유별스러웠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큰 다음에도 우리 부부는 가끔씩 그걸 꺼내서 읽어 주곤 했다. 추억이다. 아이는 오글거린다며 난리였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부부는 꽤나 진지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

가슴에는 항상 원대하고 밝은 미래 설계를 품어 쾌락보다는 성취의 기쁨을 추구하고 직분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열로써 수행하며 정신력의 기적을 믿어 어떠한 불가능에도 도전하여 실의를 딛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시고 대범하여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으며 단정한 몸가짐으로 신뢰와 의리로 남의 마음을 사며 여유와 겸손으로 일의 그르침을 자기 탓으로 돌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절제와 노력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배움에 전심하며 편견을 버리고 실용적인 사고로 자신을 닦아 부와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은 자가 되도록 하여 주소서.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도울 줄 알며 한번 입은 은혜에는 보은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화목은 사랑이 바탕임을 알게 하시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후손에게는 밝은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를 이기며 나아가 사회에 공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 1984년 4월 20일 애비, 어미가 마음을 모아 만든 기도문 -
안다. 많이 오글거린다는 거. 참 교과서적인 교훈과 교장선생님 수준의 훈화로 꽉 차있는 기도문이다. 우리 부부가 이 기도문을 쓴 보람을 느낀 것은 생각보다 훨씬 뒤인, 이십 여 년 후였다. 어느 날 대학생이던 아들이 툭 던졌던 말이 있다. “80년대 감성인건 맞는데, 엄마 아빠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절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었는지, 그건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했다. 그때 느꼈다. 기도문에 적힌 저 수많은 부모의 바람을 아이가 다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그저 우리에게 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아이로 컸다면 우린 나름 자식을 잘 키운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 참고자료 : 김영희의 『끝내는 엄마 vs 끝내주는 엄마(가나북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