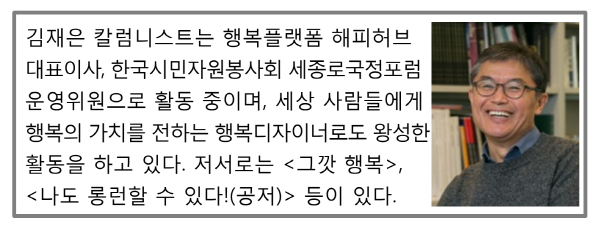[한국강사신문 김재은 칼럼니스트] 바야흐로 이야기의 시대이다.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스토리라이팅(story-writing)의 시대이다. 인생사 무엇 하나 이야기가 아닌 게 없지만. 오늘 교차로 첫 칼럼,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것이 설거지, 설거지 이야기이다. 아니 웬 설거지? 스스로도 의아해 하면서 돌아보니 어언 15년이 넘게 우리 집 설거지를 독점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선 난 설거지를 ‘돕는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남자는 설거지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서 늘 (누군가를) ‘돕는다’의 차원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기꺼이 하지 못하고 늘 생색내기가 뒤따른다. 고마운 인사라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자. 설거지는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라도 하나? 어찌 보면 자신의 식사 뒤치다꺼리하는 것이기도 하니 자신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일이 아닌 돕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일은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설거지만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어떨까?
설거지를 하다 보면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설거지가 나올 리 만무하기에 ‘살아있음’이 진한 고마움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음식장만은 해도 설거지는 대부분 귀찮아하기에 내가 도맡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 먹은 그릇들을 씻다보면 내 마음도 함께 깨끗해지는 것 같아 참 좋다. 그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바로 메모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옥의 티이기는 하지만. 그러고 보니 ‘설거지 명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난 이를 예상치 않은 즐거움, 세렌디피티라 부른다.
설거지의 역사보다는 짧지만 난 2005년부터 10년째 매주 월요일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행복편지’를 써왔다. 삶의 느낌과 생각들을 나누는 일을 쉼 없이 뚜벅뚜벅 해 나오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행복은 뭔가를 계속 반복했을 때 오는 작은 즐거움이라는 것. 그러기에 행복(幸福)은 반복해서 행하는 행복(行複)의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그래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누가 말했던가. 일상을 놓치면 행복에서 멀어진다고. 뭔가를 귀찮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발밑에서 당신을 기분 좋게 할 보물, 세렌디피티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생각하자. 자! 오늘 그런 작은 일상의 습관을 하나 찾아 실천해보자. 설거지가 아니라도.
※ 출처 : 교차로 신문 ‘아름다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