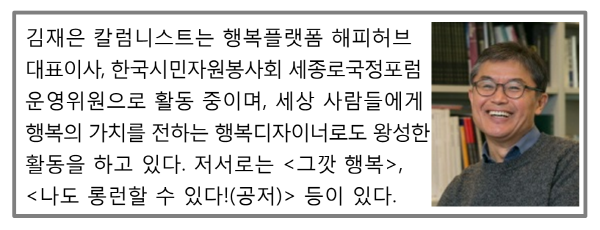[한국강사신문 김재은 칼럼니스트] 새해가 코앞인 세밑 이른 아침, 아파트 이웃 어디에선가 엄마와 딸이 싸우는지 고성이 오간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만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들려와서 그런지 울부짖는듯한 날이 선 소리들이 조마조마하다. 그런데 조금만 귀 기울여봐도 오늘 일이 아닌 ‘묵은 감정’이 녹아있는 다툼인 게 분명하다.
부부싸움도 그렇다.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언쟁을 하다가 실제 싸움의 발단이 된 ‘사소한 녀석’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케케묵은 것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어디서 줄줄줄 나오는지 그 끝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마음 한 구석에 나도 모르게 남겨진 것들이 폭풍처럼 밀려와 한 가정을 초토화시키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해본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이나 쓸데없는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강을 건너면 뗏목을 두고 가야하는데, 강을 건넜음에도 그 무거운 것을 낑낑대며 끌고 가고 있는지 희한하기도 하다. 끌고 가든 두고 가든 각자의 선택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그만이기에 그리 탓할 것은 아니라 치자.
문제는 남겨진 것들이 잠복해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언젠가 자신의 삶을 엄습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 삶에 기습적 태클로 들어와 내 삶의 자유와 행복을 망가뜨리면 어쩔 것인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쯤은 있지 않았을까.
누군가와의 사이에 어떤 감정이 남아있으면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감정 찌꺼기도 같이 내 곁에 찾아온 언짢은 느낌말이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서 내가 먼저 풀고 앙금을 녹여버리면 그만인 것을 그 ‘불편함’을 가보처럼 건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 속내가 답답함을 넘어 신기하기도 하다.
미국 속담에 ‘울고 있을 때에는 태양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내 마음과 눈을 가리는 그 무엇이 있을 때는 태양도 온전히 보기 어렵다는 말이리라. 이렇듯 남겨진 감정이며 묵혀둔 생각이 있는 삶에서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삶에 감정이나 회한을 가지고 사는 삶, 남기고 가는 삶이 어찌 좋은 삶이 될 수 있으랴.
‘빈 그릇 운동’이라는 게 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덜어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식사습관을 갖자는 것이다. 산사의 스님들이 하나의 수행으로 삼고 있는 발우공양에서 유래한 것이다. 음식 등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일석삼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좋은 운동이다. 이렇듯 남겨짐이 없으면 나도 우리도 함께 좋은 것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나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닭처럼 외친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엔 남기는 감정대신 온전하게 나의 진심이 담긴 소통을 시작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새해가 온전히 님의 것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자유와 행복의 길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음을 믿으며.
※ 출처 : 교차로 신문 ‘아름다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