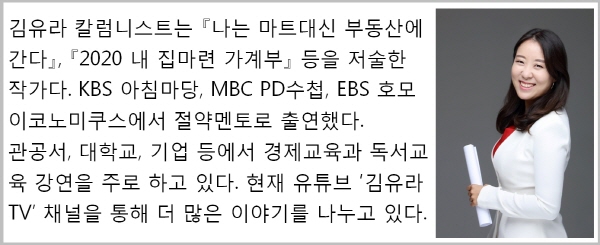[한국강사신문 김유라 칼럼니스트] 20대 중반에는 어려서였는지 기력이 좀 팔팔했다. 특히 자녀교육에 대해 열의가 넘쳤다.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책도 많이 읽었다. 미국 아이들이 듣는다는 마더구즈와 노부영(노래 부르는 영어 동화)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다 외워버렸다. 아이가 태어난 지 2주째부터 영어, 한글 동화책을 매일 읽어주었다. 일일 계획표를 짜서 오감발달 놀이와 클래식 듣기, 영어 동요 듣기를 번갈아하며 놀아주었다.
첫째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부터는 내가 평생 그렇게 사랑했던 TV를 집에서 치웠다. 수능 일주일 전까지 <가을동화>를 봤던 내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아이가 TV보다는 음악이나 책, 그리고 엄마와 친해지기를 바랐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대신 클래식과 동요로 그 자리를 채웠고, 늘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자 노력했다.
고맙게도 내 노력에 아이도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돌 즈음에는 제목을 말해주면 영어와 한글을 구분하지 않고, 단번에 책을 찾아왔다. 플래시카드를 빠르게 넘기며 놀아줬더니 인지능력도 또래보다 빨리 발달했고, 30개월쯤엔 한글을 읽었다. 아이를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이끌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그래서 둘째를 가졌을 때는 걱정은커녕 행복하기만 했다. 첫아이를 잘 돌본 것처럼 둘째에게도 벅찬 사랑을 쏟으면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형편은 좀 좋지 않아도, 그만큼 아이들에게 돈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자고 다짐했다.
나와 아이들이 모두 책상에 둘러앉아 각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꿈꾸었다. 배경으로는 은은한 클래식이 흐르고, 책상 위에 커피나 쿠키 같은 가벼운 간식이 있으면 더욱 좋고.(아무래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보다.) 학구적인 가정을 기대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옷 살 돈을 아껴 아이들을 위한 책을 사고,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샀다. 먹는 것, 자는 것 모두 아이들에게 맞추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둘째를 가졌을 때도 줄곧 아이가 ‘영재’가 되기만 바랐다. 사실 나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았다. 공부에 관심도 없었지만, 기껏 노력해도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았다. 학창시절 억지로 봐야 했던 교과서 외에 내 의지로 책을 본 것은 임신과 출산 관련 도서가 처음이었다.
공부도 못했고 좋은 대학에 가지도 못했고, 비정규직일망정 은행에 취업은 했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라고만 생각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을 좇아 투자했던 펀드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안기자 역시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랬다고 믿었다.
그러니 내 아이는 나처럼 ‘바보’가 아닌 ‘영재’로 살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 나의 목표는 하나였다. ‘나와는 다른 아이로 키우겠다.’
※ 참고자료 : 김유라의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 돈도, 시간도 없지만 궁색하게 살긴 싫었다(차이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