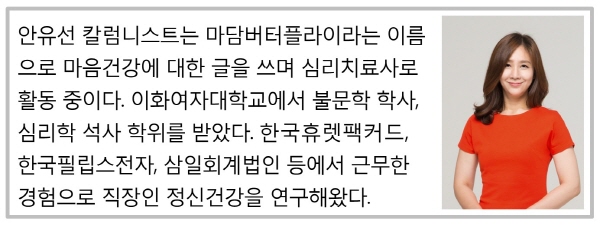마담버터플라이의 심리칼럼

[한국강사신문 안유선 칼럼니스트] “괜히 건드렸다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러지.”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해 조언을 구하는 지인들에게 심리상담을 권하면 자주 듣는 이야기다. 부모들은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은 알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문제를 감당할 자신이 없을수록 이 믿음은 완고해진다. 막연히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자녀가 수업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교칙을 어겨 징계를 받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담임선생님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부모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한다. 문제 행동이 심각할수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되었던 부모들이 자녀 문제로 상담실에 오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다. “전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저는 애를 몇 대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신을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의 고통을 전달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 자녀의 상처가 자신의 상처와 닮아있으면 문제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진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능력, 잠재력, 특기나 적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어렵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약한 부분을 가감 없이 인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중에서도 부모가 가장 바라보기 힘든 것은 자녀의 마음에 생긴 상처다. 상처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보호하지 못한 미안함,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화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상처는 저절로 치료되기도 하지 않는가? 그냥 두면 어련히 알아서 극복할 수 있는데 법석을 떠는 것은 아닌가?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상처 없이 자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라며 반문하는 부모를 자주 만난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시기를 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울 때도 있다. 단, 아무리 헌신적인 육아를 하더라도 자녀의 모든 요구를 맞추지는 못한다. 그러니 상처 없이 어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옳다.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부모 역할의 공백을 ‘보호 상실(caregiving lapse)’이라 한다. 마사 하이네만 피퍼와 윌리엄 J. 피퍼 부부는 양육 베스트셀러인 『스마트 러브』에서 ‘보호 상실’과 반복적 정서 욕구 상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피퍼 부부는 30년 넘게 심리치료와 부모 상담을 해온 심리치료 전문가다. 부모가 자녀에게 24시간 집중할 수 없어서 생기는 ‘보호 상실’은 상처로 오래 남지 않는다. 평소에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다면 부모의 관심이 간혹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보호 상실은 자녀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실패 경험이 된다. 하지만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채워지지 못하면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다. 진짜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법한 정서 욕구 상실 경험을 한 자녀에게, 그 정도의 상처는 당연히 이겨내길 바라는 부모의 생각이다.

자녀나 부모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감당하면 된다. 자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각오하고 상담실을 찾아온 어머니가 있었다. 아이의 상태도 심각했지만,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사정도 딱했다.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소개했다. 어머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것도 권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6개월 정도 받자 아이의 증상이 호전되었고 어머니도 아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건드렸다가 감당하지 못할까 걱정’이라는 말은 문제가 있음을 안다는 말이기도 하다. 감당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자녀 문제는 없다. 내 아이가 정신력이 유난히 강한 아이이기를 바라는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아이의 문제를 건드리는 전에 아이를 한 번 안아주는 것은 어떨까? 아이는 부모의 관심이 유난히 넘치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