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김수인 기자] 충북 음성의 원로문인이자 ‘음성문학의 어머니’로 불리는 반숙자 수필가가 수필인생 40년을 정리하는 수필선집 저서 <빛나지 않는 빛(북인, 2020)>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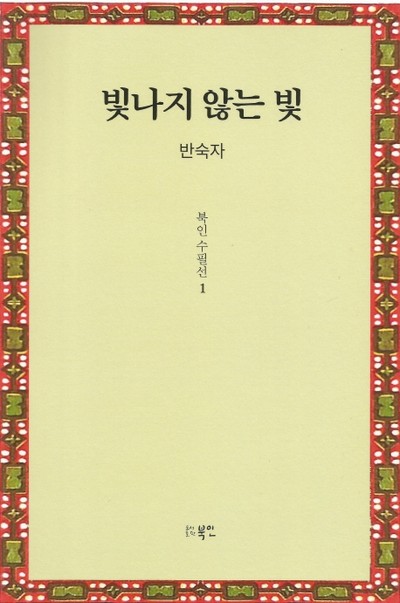
작가는 “여기 내놓은 작품들은 일곱 권의 수필집에서 가려낸 것이다. 문학적 성과가 있는 작품이라기보다 공감해준 독자들이 많았던 수필, 본인에게 의미 있는 수필, 미완이라도 애착이 가는 수필”들을 뽑았다고 말한다.
제1장 〈말하고 싶은 눈〉에 수록된 「산마을의 저녁연기」에서는 저녁연기는 그리움이고 어머니의 행주치마자락 같다고 묘사하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머니의 기도는 착하게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제2장 〈사과꽃 필 때〉에 실린 「고독한 날개짓」에서는 아름다운 노래와 목숨을 바꾼다는 가시나무새처럼 외로운 영혼의 위안이 되고 목숨의 참 의미가 되기 위해 더 높이 날아가는 고독한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 음성에 정착한 후 사과가 좋아 사과나무를 심으며 의미 있게 살았던 삶의 흔적도 여러 곳에서 보여준다.
제3장 〈열쇠 없는 집〉에 수록된 「가슴으로 오는 소리」에서는 청력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했을 정도로 절박했던 삶, 죽음의 순간에서 보여준 섬광과 들리지 않는 불행보다 볼 수 있는 희망을 선택한 저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몸으로 우는 사과나무」에선 공직에 근무하던 남편과 고향으로 내려와 과수원을 경영하며 모두가 고향을 버리더라도 고향에서 살다가 뼈를 묻자는 고향 예찬론도 펼치고 있다.
제4장 「겨울 섬진강」은 국내외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수필 8편을 모아놓았다. 특히 겨울에 문우들과 떠난 섬진강에서 벚꽃의 푸름도 없고 재첩을 잡는 사람도 없는 민낯의 강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며, 빠른 속도의 세상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흐르는 강물의 지혜를 배웠다고 말한다.
제5장 「손이 전하는 말」에는 최근에 발표한 「손이 전하는 말」과 「손」이 실려 있다. 손은 심부름꾼이라고 좋은 일, 궂은 일 가리지 않고 충직하게 소임을 다하는 심복이라고 정의한다.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 병고를 치유하는 인술(仁術)의 손이 있는가 하면 파괴와 살생을 일삼는 손도 있다며 기왕이면 좋은 손을 갖고 싶었다고 말하며 인간이 지닌 ‘손’이 가진 여러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책 속에는 “어느 날이었다. 도장을 받아야 할 우편물을 가지고 온 우편집배원이 현관에 선 채로 벽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였다. 영문을 몰라서 섰으려니 “진, 광, 불, 휘, 차암 좋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갔다. 우체부가 돌아가고 나서 그 뜻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뜻을 풀이하면 ‘참된 빛은 찬란하지 않다’로 되겠는데 빛이 빛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런 글귀를 손수 써주셨을까. 그 뒤로는 액자 앞에 서면 그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기뻤다 부끄러웠다 뒤범벅이 되었다.“라고 한다.
충북 음성의 토박이인 반숙자 수필가는 음성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주사범학교와 청주대학 행정대학을 수료한 후 1957년부터 음성군내 초등학교에서 17년간 교편을 잡았다. 1981년 『한국수필』과 1986년 『현대문학』에 천료하고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이사, 수필문우회, 가톨릭문우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음성문인협회 초대 회장과 음성예총 3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음성에서 수필작법 강의를 하는 반숙자 수필가는 40년 넘게 수필을 쓰면서, 만약 수필을 쓰지 않았다면 조금 불편한 청각장애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반숙자 수필가에게 수필은 “자폐의 광야에서 손잡아 이쪽 세상으로 안내해주었다. 부정의 암흑을 깨고 긍정의 옷을 입혀준 존재다. 독자에게 가기 전에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치유하여 재생의 옷을 짜게 했다. 그렇게 살고 보니 어느덧 석양이 내렸지만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루하루가 충만하다. 그것은 삶을 직조하는 수필이기에 가능했고 매순간 깨어 살게 하는 지혜의 샘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글을 다듬듯이 시간을 다듬은 흔적들”이라고 고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