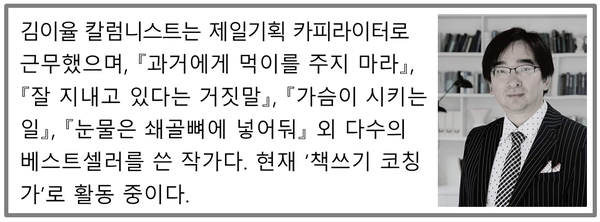![[사진출처=Pixabay]](https://cdn.lecturernews.com/news/photo/202109/75981_276111_4657.jpg)
[한국강사신문 김이율 칼럼니스트] 방에 짐이 반 이상이다. 왜 이리 잡동사니가 많은지 어지럽기가 짝이 없다. 수납박스 두 개를 산 게 엊그제인데 며칠 사이에 또 이러저러한 것들이 방바닥에 너부러져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 걸까. 방이 좁은 건지 수납박스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정리정돈을 못하는 내 탓인지.
그 놈의 짐들 때문에 내 영역은 점점 좁아진다.
이 방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나일까 아니면 층층이 쌓여 있는 저 수납박스일까. 계절이 바뀌어도 수납박스 안의 물건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다. 물건들을 그 안에 넣을 당시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생전가야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꼭 필요한 게 아니었다. 필요 없는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과 아집이 이 방을 점점 짐을 쌓는 창고로 만든 것이다.
내 머릿속은 얼마나 많은 수납박스가 쌓여 있을까. 열어보지도 않을 거면서 뭐 그리 대단하다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일까.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병이다. 다 몹쓸 병이다.
이제 버려야겠다. 이제 놓아줘야겠다. 그 생각, 그 아픔, 그 눈물.
▷ 잠시 안녕, 내 아지트
용산역 근처, 용사의 집을 거쳐 작은 골목길로 들어간다. 골목길을 나와 은행잎 나풀거리는 우측 길로 꺾어 한 삼백 걸음 정도 걷는다. 서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한적하고, 음산한 기운마저 감돈다. 그래서 오히려 좋다. 나만 아는 비밀 장소인 것 같아, 숨겨놓은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아 맘에 쏙 든다.
도착한 곳은 그 자리에 오래도록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하 헌책방. ‘뿌리 서점’
오늘도 주인아저씨는 책방 입구에서 고물상에서 수거해온 수명 다한 책들을 부여잡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책들이 두근두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지하로 통하는 그 좁은 계단을 내려갈 때면 벌써부터 설렌다. 오늘은 어떤 책이 나를 맞이할까, 어떤 책과 눈을 마주칠까, 어떤 책이 내 허기진 영혼을 충전시켜줄까. 계단을 타고 책들의 깊은 향과 재잘거 림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사방천지 책, 키보다 높은 책, 발에 밟히는 책.
주인아저씨가 건넨 종이컵 커피와 함께 책을 펼쳐본다. 페이지마다 꽂혀 있던 사연들이 가슴에 들어오고 순간, 온몸이 따뜻해진다. 아, 책의 감옥에 갇힌다면 무기징역이라도 좋다. 얼마나 행복한 한나절이었을까. 검은 비닐봉지에 일용한 마음의 양식을 가득 담아 헌책방을 나선다. 나풀거리는 은행잎 거리를 지나 작은 골목길을 지나 용사의 집을 지나 용산역 광장으로 간다. 담 올 때까지 잠시 안녕, 내 아지트.
※ 참고자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새빛, 2020)』
칼럼니스트 프로필